|
|
 |
 > 정보마당 > 문학자료실 > 정보마당 > 문학자료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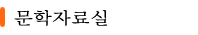 |
 |
 작성일 : 10-02-01 11:29
작성일 : 10-02-01 11:29
|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1987-1994)
|
 |
|
글쓴이 :
문학관리자
 조회 : 4,332
|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 1987년-1994년
*********************************************************************
신춘문예 당선작 1987
중앙일보 이재창李在昶 거울論
동아일보 崔度善 風俗圖
조선일보 全秉喜 山門에 기대어
대구매일 閔炳德 山세월
**********************************************************************
거울論
이재창(李在昶. 중앙일보 당선)
화면처럼 어둔 세상 低音으로 깔려와도
우리들 허무 몇 잎 낙관 찍혀 붉어온다
내 분신
벗어 던져도
전율 없는 너의 촉각.
하늘 아래 모든 것들 제 모습을 지니지만
거리의 네 가슴은 잠시 잠시 백지장뿐
우리들
얼굴 함축된
수줍음이여, 벌거숭이.
너는 항상 방패없이 위태롭게 질문하고
질문 받는 우리들은 대답하다 넘어진다
제 모습
뽐내는 세상
아아, 칼날이 떠는 字母. (박재삼.이근배 選)
風俗圖
崔度善(동아일보)
Ⅰ. 연
가난이 마냥 곱게
물이 드는 정월이면
연연한 창공으로
祝文 하날 띄우나니
군청색
連峰 사이로
浮沈하는 고향하늘.
얼레에 감긴 시름
빙빙 도는 한 생애를
늦췄다 당기면서
잉아실에 귀를 모면
촉촉히
젖어만 오는
저 始原의 숨소리.
Ⅱ. 널
열 아홉 꽃각시로
불이 붙는 뜨락에서
가슴을 헐어내면
고향문도 열리리니
빈 방에
물빛 벽지를
자로 재듯 바르리라.
한 소절 음악으로
조요로히 흐르는 강
자벌레 눈금을 헤듯
건너야 할 물이라면
절망을
배우기 위해
솟음직도 하더니라.
Ⅲ. 그네
찻잔을 비우듯이
想도 念도 비운 날에
내 아픈 손을 적실
두 줄을 잡고 보면
얼비친
치맛자락에
물이 드는 동양화.
겸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오르고 내려 오는
팽팽한 길목에서
힘 주어
굴러를 봐도
돌아오는 제자리여.
Ⅳ. 팽이
채우고 또 채워봐도
허전한 삶의 둘레
간절한 그리움이
허리까지 밀려오면
윙윙윙
소리를 지르며
몸을 틀고 있나니.
채찍에 휘감길수록
일어서는 매운 절개
불면의 창 너머로
푸른 물이 뚝뚝지면
춘향이
옥문을 나듯
고샅길을 돌았다. (이우종.박재삼 選)
~~~~~~~~~~~~~~~~~~~~~~~~~~~~~~~~~~~~~~~~~~~~~~~~~~~~~~~~~~~~~~~~~~~~~~
山門에 기대어
全 秉 喜(조선일보)
<1>
후두둑 햇살이 떨어지는 산허리에
우주가 추락하는 淸明이란 悲鳴소리,
가만히 마음 달래면 계절이 끌리는 소리.
<2>
하늘 한 폭 베어 물고 말이 없는 긴 이야기,
너는 또 내게 와서 산을 하나 내려놓고
저만치 일어나 앉아 그 눈빛을 덜어주고.
<3>
어디고 돌아갈 곳은 풀빛 향수 깊은 골짝
더러는 내가 나를 불러보는 메아리에
가다가 뻐꾸기 울어 가만 끌어 세우던 곳.
<4>
속옷을 파고드는 흙 냄새며 빈 가슴을
그 어느 王朝의 뜰 궁전처럼 섰는 銀杏,
스님은 山門을 열어놓고 어디론가 가고 없고
<5>
청솔 사이 익는 머루 하늘 지킨 순한 짐승,
가진 것 던져두고 빛난 것 벗어 두고
구름과 바람 더불어 산도 짐을 풀었다. (이태극 選)
~~~~~~~~~~~~~~~~~~~~~~~~~~~~~~~~~~~~~~~~~~~~~~~~~~~~~~~~~~~~~~~~~~~~~~
山세월
閔 炳 德(대구매일)
(1)
둘러 보면 푸른 詩句
줄기 줄기 一萬章을
철따라 새들 가락
골을 넘쳐 하늘을 울려
수굿이 이끼 쓴 바위는
터를 잡은 神仙이여.
(2)
저마다 아픔일랑
뿌릿결에 감추이고
잎새 몽땅 훑긴 날도
어디 悲鳴 있었던가
늘 낮춰 갈 길만 걷다
떠날 줄도 아는 溪流.
(3)
뜬 마음 흰 구름 조각
능선 숲에 잠들 즈음
달마중 키를 높여
초목들은 설레이고
온 산은 명상에 졸다
默示의 눈을 뜬다. (박재삼 選)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88
조선일보 고정국 길
중앙일보 도리천 산문에서
서울신문 김홍렬 산을 오르며
경향신문 손수강 靑鶴洞 이야기
경남신문 金東烈 大島에서
대구매일 李益柱 떠나가는 그대에게
동아일보 서재환 佛國土記
**********************************************************************
길
高 正 國(조선일보)
(1)
한 세상 사는 것이
다 길이라 하는 것을,
물빛 글썽이는
山만 보고 가노라면
세월은
소롯길로 와서
억새꽃을 피웠네.
(2)
노을녘 산마루엔
하늘만한 뉘우침이
웃자란 억새밭에
하얗게 눕던 날은
길잃은
조랑말 한 마리
山을 향해 울었다.
(3)
반 평생 구빗길을
먼 발치로 따라와서,
때로는 이맛섭에
주린 듯 돋는 별빛.
그 순명(順命)
비포장길에서
삐걱이는 내 수레여. (리태극 選)
~~~~~~~~~~~~~~~~~~~~~~~~~~~~~~~~~~~~~~~~~~~~~~~~~~~~~~~~~~~~~~~~~~~~~~
山門에서
都 利 天(중앙일보)
山門에 기대 서서
아침해 바라보면
그림자 산문 밖으로
身熱처럼 길게 눕고
해질녘 그림자 다시
산문 안으로 누워든다.
일순간 한자리에 서서
이저승 오가는 삶에
그 어디 놓아도 좋을
마음 하나 나 하나
우러러 푸른 학처럼
날고 싶은 저 永遠.
난초꽃 향기에 묻혀
솔바람 메아리에 묻혀
눈에 뵌 생각, 모습
맑은 날 한 점 구름인데
열리는 하늘의 境界
산이 솟아 흐른다. (박재삼.이근배 選)
~~~~~~~~~~~~~~~~~~~~~~~~~~~~~~~~~~~~~~~~~~~~~~~~~~~~~~~~~~~~~~~~~~~~~~
산을 오르며
김 홍 렬(서울신문)
새벽찾아 가노라면 물깊은 山의 모습
어둠자락 걷어내고 꽃을 바라 모두운다
깊숙한 根本 한 곳에 돌아설 듯 뒤채는 깃
스스로 묻고 대답하여 물굽이 설움되는
悲戀의 몸짓으로 가슴의 새털을 턴다
후두둑 날아오를 듯 손을 뻗는 구름山
淨土마다 피어있는 들꽃들을 모아들여
쑥불로 태워보는 새로 오는 神의 소리
흐르는 강물인지라 귀 밝히는 메아리
山 사이로 길을 가면 어느새 鶴이 되고
山의 울음 네 절규가 수밀도로 떠오를 때
한 줄기 폭포수되어 떨어지는 궁녀같아
하늘이여 강이여 이 함성을 어찌 하리
北邙이여 끝끝내 대답않는 道峰이여
하나 둘 떠나고 나면 오래된 이야기뿐.
겨울날 우리들 배고픈 그 어느 날에
혼자서 세상에 남아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갈매빛 산 하나 무너져 우리 사는 들판 되리. (정완영.김제현 選)
~~~~~~~~~~~~~~~~~~~~~~~~~~~~~~~~~~~~~~~~~~~~~~~~~~~~~~~~~~~~~~~~~~~~~~
靑鶴洞 이야기
손 수 강(경향신문)
頭流山 물소리가 舍利 몇 섬 부리시는
靑鶴洞 들어서야 뒷짐 진 세월 만나것다
千年을 선 채로 흐르는 그걸 그냥 보것다.
바둑으로 친다치면 넉집 半은 덤으로 받은
바위와 그보다 많은 連峯들이 제 자리 놓인
布石도 저쯤은 돼야 구름 정도는 불러 앉히지.
안그런가, 약초 캐고 祭 지내는 거 말고라도
바람막이 山竹으로 家風을 두른 초가집들
무심한 저 線이 살아 頭流山 능선 이루는 것을.
原始의 沈默 같은 고요의 그 水深 같은
섬진강물 밀어올리는 丹靑빛도 게워내고
돌 속에 누운 鐘소리마저 깨워 울리는 것을.
山茶花 한 잎 뚝 져도 境界가 달라지는
靑鶴洞 깊은 골에 와 하늘 인 뜻 내 알것다
선 채로 千年 흐른 뜻 이제 죄다 알것다. (김상옥.이상범 選)
~~~~~~~~~~~~~~~~~~~~~~~~~~~~~~~~~~~~~~~~~~~~~~~~~~~~~~~~~~~~~~~~~~~~~~
大島에서
金 東 烈(경남신문)
해조음 밀려드는 비릿한 해변에 서면
발동선 헐떡이면서 섬 하나 부려놓고
썰물에 허기진 갯벌 裸身으로 일어선다.
폐수에 멍이 들어 난파당한 흔적마다
갈증으로 타는 노을 열병처럼 번지는데
뭍으로 향하던 祈求 해당화로 피어난다.
오색 깃발들이 눈부신 파도로 와
불씨 하나 지펴 들고 망부석에 감긴다
선창엔 달빛 바늘들이 찢긴 시대 깁고 있고. (서벌 選)
~~~~~~~~~~~~~~~~~~~~~~~~~~~~~~~~~~~~~~~~~~~~~~~~~~~~~~~~~~~~~~~~~~~~~~
떠나가는 그대에게
李 益 柱(대구매일)
누가 이 작은 가슴을
날 선 바람으로 가르는가.
끌어 당기며
풀었다가 다시 죄며
후두둑
音階을 밟고
떠나가는 그대는
아픔의 가장자리
맥을 찾아 짚어가며
피묻은 손 끝으로
뜯어내는 내 가얏고는
또 다시
虛日의 쓰림에
흐느끼고 있는가.
지울수록 더 선명한
너의 흔적 뿐이던가
세월 또한 보름밤엔
속살 원한 달로 뜨고
한 맺힌
방망이질로
내 가슴을 치고 있다.
찌든 宗家에도
댓잎은 시퍼렇고
기왓골 타고 내리는
먼 하늘 바라보며
비워둔
가슴이 외려
千斤으로 무겁다. (박재삼 選)
~~~~~~~~~~~~~~~~~~~~~~~~~~~~~~~~~~~~~~~~~~~~~~~~~~~~~~~~~~~~~~~~~~~~~~
佛國土記
서 재 환(동아일보)
높지도 않은 산인데
골은 왜 으늑하냐
밟히는 자욱마다
일어서는 봄풀 소리
여기가 절터였나 봐
香내음이 감돈다.
陰刻된 세월 破片
묻혀 있는 골짝마다
石塔은 木蓮처럼
땀 흘리며 무너지고
부처로 태어난 돌들이
이끼 속에 또 묻혀
벼랑에 새긴 線은
달무리 머금은 미소
그날의 釘 소리를
혼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출렁이는 바다
法悅의 파도 소리 (정완영.박재삼 選)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89
동아일보 이동백 水沒民
부산일보 정성욱 겨울바다
대구매일 宋鍾旭 사랑 法
서울신문 이지연 미루나무의 새
중앙일보 金久夫 南大門 앞에서
경향신문 柳川里 겨울 風葬
경남신문 남외경 밤바다
조선일보 卞永敎 꽃을 위한 瞑想
**********************************************************************
水沒民
이 동 백(동아일보)
물 깊이 들 수 있다면 헌 신도 벗어들자
저기 섬이 되어, 歸鄕하는 철새 되어
月川里 수평선 아득히 浮漂처럼 떠 보자
廢木船 허리에 감겨 일렁이는 그리움으로
헛배부른 어린 날 어머니의 웃음소리며
비어서 정작 가득한 마음을 건져내 보자
한쪽 다 허물어진 굴렁쇠 굴러가듯
구름이 길을 열어 옛마을로 들어선다
아우성, 아우성처럼 던져보는 돌팔매
어디를 우러러도 싸늘한 異方 하늘
너와 나 명분도 없이 가슴을 앓는 날은
물이끼 퍼렇게 돋은 전설들을 얘기하자 (정완영.박재삼 選)
~~~~~~~~~~~~~~~~~~~~~~~~~~~~~~~~~~~~~~~~~~~~~~~~~~~~~~~~~~~~~~~~~~~~~~
겨울 바다
정 성 욱(부산일보)
이 한밤 파도 소리 신열로 뒤척이다.
물빛 푸른 내 영혼을 저 물결로 불러내어
사랑의 呪術에 홀려 投身하는 겨울 바다.
수천 필의 바람들이 머리풀고 일어선다.
저 어둠 풍경 곁을 거머쥐는 안개 몇 폭
한 음계 부리를 물고 철새가 날아간다.
옷자락을 감는 추위 웅크린 척추마디
노래는 맨발로 모래알을 밟고 가다
저 바다 아득한 수평 흰뼈로 돌아눕다.
눈썹인 듯 지나온 길 머나 먼 뱃길인데
꽃그리매 지친 꿈을 어기 어사 노 저어라
해풍에 머릿칼 적시며 투망하는 사내들.
기러기 깃을 털며 물굽이로 달아 나고
갈증을 뜯는 木船 집어등이 흔들린다
출항제 지친 가락에 울며 뜨는 저 달빛.
혼자서 다함없는 아픔들을 풀어내면
아아, 예감하여 얻는 겨울바다 몇 개의 構圖
뜨거운 가슴을 쓸며 부끄러움을 말린다. (김상훈.임종찬 選)
~~~~~~~~~~~~~~~~~~~~~~~~~~~~~~~~~~~~~~~~~~~~~~~~~~~~~~~~~~~~~~~~~~~~~~
사랑 法
宋 鍾 旭(대구매일)
어느 뉘 불씨 모아 이 어둠 삭힐건가
바다의 그리움이 둥근 달을 부려놓아
우리라 이름 새기는 눈빛들이 서럽구나
돌아서면 紅疫을 앓아 항시나 머언 들녘
푸른 강의 呼名은 땅 적시고 낯 붉은데
가슴 속 박힌 얼굴은 씨앗처럼 주저하네
언제 쯤 속살 가득 꽃불이 타올라서
눈보라에 흩어지는 까마득한 길을 열어
잠 못든 마른 꿈들이 불을 물고 빛이 될까
볼 비벼 야윈 밤은 굽이 돌아 흐르는가
햇살 다 입다물어 빈 가지로 뒹굴어도
쌓아둔 무늬 키우며 바람으로 살겠네 (이근배 選)
~~~~~~~~~~~~~~~~~~~~~~~~~~~~~~~~~~~~~~~~~~~~~~~~~~~~~~~~~~~~~~~~~~~~~~
미루나무의 새
이 지 연(서울신문)
잎들 다 떨어버린
미루나무 손끝 저편
먼지낀 일상들의
숨가쁜 가슴 위로
한 오리 새의 울음이
흰 그늘로 젖는다
피안의 길목에서
몸살 앓은 낙일 하나
가을강 뿌리에 젖는
과원의 노래들은
어느 먼 失地로 흐를
나지막한 기도인거
어둠속에 소슬히 뜬
가지 끝의 새 한 마리
돌아오지 않는 날의
메마른 기다림을
교외선 따라 흐르는
갈대밭에 흩뿌린다 (정완영.김제현 選)
~~~~~~~~~~~~~~~~~~~~~~~~~~~~~~~~~~~~~~~~~~~~~~~~~~~~~~~~~~~~~~~~~~~~~~
南大門 앞에서
金 久 夫(중앙일보)
만남도 허물어짐도 因緣의 힘인 것을
궁그려 헤아려보면 歷史를 떠메온 아픔
짓눌린 톱니바퀴 소리 영원도 순간에 있다.
세월을 여닫고 선 채 花冠쓴 舞童이어라
丹靑에서 묻어나는 빛, 恨인가 箴言인가
한바탕 들쑤신 속이 山嶽보다 의연하다.
自足의 꿈일망정 소중히 다져둔 이 뜰
시각을 모를라치면 달빛이나 쬐일 것을
열지어 돋아나는 驚異, 미소인 듯 默示인 듯.....
아무 때 찾아가도 흔들리는 文明의 손
높게 쌓아 올릴수록 回憶 더욱 적막하고
돌에도 목숨이 있는가 되감기는 忍苦의 끈.
수줍어 애태워서야 가다득 먼 약속일뿐
사무친 祈願이 허망으로 돌아 누우면
스스로 戒를 깨뜨리며 서성대는 긴 旅程.
폐허건 幻戱의 불씨건 七寶빛 흔적이여
밤새 퍼담아도 마르지 않는 秘義의 떼
이끼를 털어낸 자리에 金싸락을 묻어 본다. (박재삼.이근배 選)
~~~~~~~~~~~~~~~~~~~~~~~~~~~~~~~~~~~~~~~~~~~~~~~~~~~~~~~~~~~~~~~~~~~~~~
겨울 風葬
柳 川 里(경향신문)
빈 들판 바람소리 日歿쪼는 가마귀떼
눈보라로날려오는 허허한 상심 끝에
눈이 먼 새나 한 마리 가슴으로 날린다/
끈끈한 바람의 피 돌고 도는 地脈속을
꽁꽁 언 말씀의 꽃 마지막 노래 하나
그 불씨 타고 또 남은 말이 없는 저 몸짓.
나날의 살아있음 죄인 듯 송구한 날
아픔을 文身하듯 밤 벼랑을 오르다가
육신은 쥬라기代의 새(鳥)화석이 되는가.
언 땅속 피가 도는 맨살의 바람깃에
천고의 숨이 터서 다시 살을 넋의 새여
들머리 나래 저어 갈 강 언덕이 보인다. (김상옥.이상범 選)
~~~~~~~~~~~~~~~~~~~~~~~~~~~~~~~~~~~~~~~~~~~~~~~~~~~~~~~~~~~~~~~~~~~~~~
밤 바다
남 외 경(경남신문)
설레어 다투던 파도 해거름에 몸져눕고
포말 빈 가슴은 아직도 허기져서
물안개 끄는 수레에 은하를 건너가네.
귓부리 흔들리는 내밀한 바람결에
닫혔던 살(肉)을 열어 깊이 깊이 안기는 녘
자욱히 생각이 내려 머릿결을 쓸어 준다.
찾아 헤매는 숙면 휘파람도 지쳐버리고
긴 밤 가로지르는 적막한 울음 몇 줄
그 끝에 끝내 내쳐진 저 알몸의 바다 하나. (서벌 選)
~~~~~~~~~~~~~~~~~~~~~~~~~~~~~~~~~~~~~~~~~~~~~~~~~~~~~~~~~~~~~~~~~~~~~~
꽃을 위한 瞑想
卞 永 敎(조선일보)
비 개인 그날같이
한 하늘이 열리던 날
두레박 몇 劫을 내려
옹이 맺힌 결을 풀고
싱그런 淸福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는다.
뒤돌아 어지러운
익모초 달인 강물
고즈넉이 얹고 보면
절정에서 타는 개화
누구도 드러내지 않는
살아 아픈 숨결소리......
未踏의 설운 땅에
누가 먼저 旗를 꽂나
섬짓 섬짓 에인 칼끝
살로 웃는 아침 한때
꽃들은 어깨를 포개어
마파람을 쓸고 있다. (리태극 選)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90
서울신문 강문신 立石里 산과 바다
중앙일보 박정수 도계에서
조선일보 김태자 山家消息
동아일보 염창권 강가에서
경향신문 고규석 겨울 午陰里
매일신문 이명숙 숲 日誌
**********************************************************************
立石里 산과 바다
강 문 신(서울신문)
또 한해 보내는가,
잿마루에 올라서면
침침한 눈 비비며
바다끝도 잠겨 있다.
海潮音
아득한 너머엔
떠서 도는 馬羅島
우리가 심은 것은
귤나무만 아니었다
마른 나무 가지 끝에
겨우내 감긴 눈발
立石里
애타는 燈불은
귤빛으로 익었었다
漢拏山 눈보라야
모닥불이 아니던가
기슭의 봄소식은
자리마다 밟히는데
풀피리
연련한 가락에
실려도 올 水平錄
~~~~~~~~~~~~~~~~~~~~~~~~~~~~~~~~~~~~~~~~~~~~~~~~~~~~~~~~~~~~~~~~~~~~~
도계에서
박 정 수(중앙일보)
오랜 잠적의 시간을
어둠 속에 묻어 두고
생성의 年代속에
광맥을 더듬다가
한 번은 타올라야 할
原始林의 불꽃이여.
캄캄한 막장의
절망을 걷어내고
살아 아픈 날들을
버팀목으로 이겨내며
뜨거운 폐활량으로
호흡해 온 오지의 땅.
땅 속 깊이 묻은
단단한 불씨의 희망 속에
언 땅의 地脈속을
파돌고 도는 네 사랑은
따스한 이웃의 불로
다시 살아 나는가
선혈의 뜨거움을
가슴 깊이 지닌 채로
新生의 석탄들을
貸車에 실어 보내면
비어 낸 산 하나 무너져
平原 같은 세상 되리.
~~~~~~~~~~~~~~~~~~~~~~~~~~~~~~~~~~~~~~~~~~~~~~~~~~~~~~~~~~~~~~~~~~~~~~
山家消息
김태자(조선일보)
하늘 밴 솔숲구비
밝아드는 창 저켠에
매캐한 짚불 내음
목메기로 반겨 서면
산그늘 잠긴 水面에
지난 세월 떠오르고
마루턱 넘어서는
바람소리 아름 안고
쟁기랑 챙겨 지고
묵정밭을 갈다 보면
풀향기 저녁 비알에
하루 해가 저문다.
먼 소식 이슬방울로
발목 젖어 앙금지면
가슴 헤친 골짝에
해묵은 고뇌를 묻고
꿩 울음 하이얀 입김따라
산꽃으로 다시 핀다.
~~~~~~~~~~~~~~~~~~~~~~~~~~~~~~~~~~~~~~~~~~~~~~~~~~~~~~~~~~~~~~~~~~~~~~
강가에서
염 창 권(동아일보)
철 지난 가슴으로 강가에 나앉으면
갈대숲은 새 떼를 희게 날려보내고
우리의 아픔은 끝내 물비늘로 저민다.
들판에 홀로 서서 낮은 하늘 바라보다
손사래 여는 눈빛 떠나가던 무딘 팔뚝
보인다, 강울음으로 일어서는 믐짓이 ‥‥
밤의 끝엔 길눈 덮는 눈발이 몇 자나 될까
흰 옷의 말씀으로 세상이 문득 밝는
기러기 무리져 내려
뉘어보는 바람숲을.
굽도는 마음마다 깊디 깊은 흐름으로
이제는 들아가서 돌아설 듯 멈추리라
동백꽃 붉은 가슴에 등불 켜는 그 목소리.
~~~~~~~~~~~~~~~~~~~~~~~~~~~~~~~~~~~~~~~~~~~~~~~~~~~~~~~~~~~~~~~~~~~~~~
겨울 午陰里
고 규 석(경향일보)
눈 내린 막장 저린 세상은 낮아지고
고단한 年代를 앓는 영하의 기침소리
무심히
잠들 수 없는
이웃들이 일어선다.
날품에 굽은 등이 半生의 전부냐고
갱도의 굴뚝새가 객혈을 쏟는 겨을
구차한
목숨을 밝힐
아침 해도 비껴간다.
어둠과 내통하는 암울한 지층마다
침묵을 찍어내는 解氷의 굴착소리
천리 밖
파묻힌 꿈이
불씨로 깨어 난다
햇빛을 쏟아서는 밝히지 못할 이 땅
불문율을 새기는 광부여 내 리 쳐 라
끈질긴
어둠의 습성
뿌리까지 흔들린다
몇 겹을 짓밟혀야 밤하늘 별로 뜨랴
화석처럼 파묻혀 간 시대를 다스리며
한 겨을
어둠을 사뤄
동백꽃을 피운다.
~~~~~~~~~~~~~~~~~~~~~~~~~~~~~~~~~~~~~~~~~~~~~~~~~~~~~~~~~~~~~~~~~~~~~~
숲 日誌
이명숙(매일신문)
별이 되지 못한 손끝 뉘 가슴만 두드리나
날마다 산녘 바라 걸어가던 저 발길에
울음을 들마루로 빻아도 폴폴나는 저 볕살.
목쉰 가슴팍에 깃들 새소리도 잠기는 雨期
미친 듯 머리 흔들어 쳐다보면 고인 울음
아픔도 아름으로 벌어 길고 긴 날이 되나.
숨소리 낮고 높음도 저 하늘 물빛이다가
어딘들 둘러봐도 떠날 곳 하나 없고
저 들녘 풀씨 터뜨려 불로 불어 타고 있다.
눈발 허공을 짚다 귓볼 대는 바람 앞에
핏금처럼 남은 기억 먼 하늘로 보듬다가
먼 강물 얼음 깨지는 소리 가지마다 얼비친다.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91
조선일보 채천수 겨울산 步法
동아일보 강문신 馬羅島
중앙일보 양영길 나의 發願
매일신문 이문균 꽃솎기
경향신문 申鉉培 동치미
경남신문 河順姬 길목에서
부산일보 김현우 指南針
**********************************************************************
겨울산 步法
채 천 수(조선일보)
다시 침묵을 위해 문을 닫는 산에 든다
빈 나날 이 허망에 무릎까지 오는 낙엽
헛디딘 발자국 찾아 내 여기 또 왔네.
이마를 타고 앉던 굽이친 능선들이
뒷덜미 잡아채서 푼수대로 이던 하늘
흰구름 건너는 갖달 고삐 되어 걸렸었지
힘겨운 글 마루 발 아래 굽어보니
버리면 쉬웠으리 부질없는 짐보따리
이제야 호흡 낮추어 걸음 사려 놓는다
무딘 날 날을 세워 비뚠 가지 잘라 내고
목숨의 눈 먼 둘레 얼룩도 닦아내고
다시금 햇살 창창할 꿈을 찾아볼 일이다
~~~~~~~~~~~~~~~~~~~~~~~~~~~~~~~~~~~~~~~~~~~~~~~~~~~~~~~~~~~~~~~~~~~~~~
馬羅島
강문신(동아일보)
차오른 생각에는
내 누이가 있습니다
산기슭 갯마을이거나
水平線 끝 닿은 데거나
누이는
빛 바랜 바다로
그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한 식구가
불빛으로 모여 살 땐
빈 소라 껍질에도
만선 꿈은 실렸습니다
水平線
그 한 굽이에
마음뿐인 山과 바다
馬羅島 선착장은
받아 든 밥床입니다
허술한 초가지붕
덧니 물린 호박꽃도
그 여름
놓친 반딧불
별빛 따라 내립니다.
남녘 섬하늘의
인연도 끝 간 자리
바다는 어디에도
가는 길만 열려 있고
서낭당
소망은 하나
둥근 사발달 뜹니다
물마루만 바라봐도
청보리밭 키 큰 누이
한 점 바닷새가
저녁놀을 싣고 와서
輪廻의
섬바위 끝에
하얀 집을 짓습니다.
~~~~~~~~~~~~~~~~~~~~~~~~~~~~~~~~~~~~~~~~~~~~~~~~~~~~~~~~~~~~~~~~~~~~~~
나의 發願
양 영 길(중앙일보)
등짐을 부려놓고 秋史誇에 들렀었지
한 평 반 토방에선 강물소리 그득한데
모습도 매운 바람만
지게문을 흔들고.
歲寒圖에 담은 넋을 몇마디 여쭈었지
소나무 저리 두고 눈덮인 동산 향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만 내 저었지 .
두 손을 움켜 쥐면 수선 하나 피워낼까?
감았던 눈을 뜨고 하현달만 바라보며
내 등에 짐을 지운다
그 수선 뿌리 같은
세상의 뒤쪽들엔 저 歌山도 말이 없네
먹을 간다. 가슴을 간다 바닻물로 산을 간다.
붓매에 머무는 눈매
물소리만 들려라.
고개를 끄덕이면 저 달빛은 더 환한데
어인 일로 자지 못해 가지 끝에 걸렸을까?
산자락 저리 휘어도
저 바다는 푸르를까?
돌아서는 내 발길을 하늘만 쳐다보네
뜰 앞 잔설 위를 낙관찍듯 앉아본다.
오늘 밤 나의 발원을
눈송이야 쏟아져라.
~~~~~~~~~~~~~~~~~~~~~~~~~~~~~~~~~~~~~~~~~~~~~~~~~~~~~~~~~~~~~~~~~~~~~~
꽃솎기
이문균(매일신문)
산비탈 가파른 곳 오르고 또 오르며
선혈처럼 쏟아지는 가난을 뒤척인다.
죽어도 일어서야 하는 시간들을 위하여
주름진 이맛살에 세월을 동여맨 채
마을의 빈뜰 위에 오월 한낮 햇살 쏟으면
엉켜진 뻐꾹새소리 이 산 저 산 넘나들고
마른 대궁 야윈 가슴 골을 따라 흘러가면
본디 내 모습은 산비탈에 홀로 앉아
허기진 지친 손으로 숨을 쉬는 저녁 강.
~~~~~~~~~~~~~~~~~~~~~~~~~~~~~~~~~~~~~~~~~~~~~~~~~~~~~~~~~~~~~~~~~~~~~~
동치미
申 鉉 培(경향신문)
1
할머니 살아 생전
눈물 많은 섬을 놓아
적당한 소금기로
간을 맞춘 겨울바다,
그 바다 얕고 좁아도
多島海 이루었네.
2
섬과 섬 사이사이
浮標로 띄운 댓잎
동지섣달 서릿바람
서걱서걱 밟고 가면
바람에 씻긴 섬들이
성에 같은 눈을 뜬다.
3
한 사발 넋을 부어
차오르는 설움이여.
썰물되어 떠난 얼굴
지워진 그 자리에
서릿빛 그리움으로
목이 메는 물소리. (김상옥.이상범 選)
~~~~~~~~~~~~~~~~~~~~~~~~~~~~~~~~~~~~~~~~~~~~~~~~~~~~~~~~~~~~~~~~~~~~~~
길목에서
河 順 姬(경남신문)
먼지 내린 벽지위에
잠겨가는 또 한 해
절망의 한 올마저
노래하고 싶은 날은
아득한 시대의 한켠
물안개로 젖어오고.
녹여도 끓여봐도
어찌하지 못하는
고단한 잠을 끌던
저 결빙의 바람소리
굳은 손 포개 잡은 채
여울로 누워 있다.
마침표를 찍지 못해
살아 남은 쓸쓸한 밤
진폭을 더해주는
매운 연기 속에서
허기진 세월 자락을
바늘귀에 꿰어 본다.
더러는 가슴치며
회한으로 접는 일도
불씨처럼 다독여
가슴안에 묻으면
영혼의 꽃씨 몇 알이
비상하고 있었다. (김상옥 選)
~~~~~~~~~~~~~~~~~~~~~~~~~~~~~~~~~~~~~~~~~~~~~~~~~~~~~~~~~~~~~~~~~~~~~~
指南針
김 현 우(부산일보)
짚멍석 굿놀이판
똬리 틀던 징소리로
한 구비 돌고 가면
또 한 구비 짚던 허방
가다가 손(鬼)없는 날도
혹간 있긴 하데만.....
안동포 멕인 풀에
배어나던 서릿바람
신 오른 내림대 끝
떨고 있던 청댓닢을
정화수 어린 물빛에
산빛 받아 앉힌다
파르르 곧은 철침(鐵針)
침묵으로 떨 적마다
山 한 點 피가 트고
내(川) 한 금 脈이 놀아
윤유월 숨막힌 더위도
흘러 강물 푸르다
꼿꼿이 찔러 오는
서슬빛 푸른 箴言
간절히 찾고있는
저 세상 어드메쯤
한 목숨 피던 그 뜻이
꽃잎으로 지는가. (정완영.임종찬 選)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92
중앙일보 신희숙 목수
동아일보 임찬일 겨울 설악에 와서
서울신문 하순희 이중섭의 흰소를 보며
조선일보 권갑하 처용의 탈
매일신문 서숙희 소금꽃
**********************************************************************
목 수
신 희 숙(중앙일보)
우리가 잘린 것은 그대의 뜻이었다
살갗을 밀어내고 매끄럽게 다듬어서
망치로 힘껏 두들겨 찌든 벽에 붙였다.
우리가 차렷 자세로 줄을 서 있을 때
목에 박힌 못 빼려고 힘줄을 세웠지만
깊숙이 박힌 상처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우리들의 죽음을 확인해 보려고
또다시 쇠망치 내리치려 하는데
적들이 힘없이 무너져 삭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차라리 썩어지길 바랐는데
살갗 틈새마다 방부제 채워 넣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단가면 씌웠다.
그대 몰래 키운 벌레가 그 가면 갉아먹고
댑사리 비웃고 선 누리팅한 잇사이로
겁먹은 그대의 눈빛이 빨려들고 있었다.
~~~~~~~~~~~~~~~~~~~~~~~~~~~~~~~~~~~~~~~~~~~~~~~~~~~~~~~~~~~~~~~~~~~~~~
겨울 설악에 와서
임찬일(동아일보)
보아라! 저것이 동양의 솜씨려니
여백을 실컷 살려 흰 눈발을 그리거니
과감한 생략법으로 하늘도 처리하고.
틀을 짜고 나면 더 많이 놓치는 법
한사코 안에서만 지우고 그리는 선
더 크고 훌륭한 것은 바깥쪽의 풍경인 걸.
바위는 사내처럼 굵은 뼈로 울고 있다
밑그림 다시 고쳐 덧칠도 벗겨내고
안으로 삼키는 눈물 깎을수록 뜨거운 몸.
~~~~~~~~~~~~~~~~~~~~~~~~~~~~~~~~~~~~~~~~~~~~~~~~~~~~~~~~~~~~~~~~~~~~~~
이중섭의 흰소를 보며
하 순 희(서울신문)
한 획 등뼈처럼 내리그은 화필 끝에
언 땅을 노려보는 잠들 수 없는 눈빛
삭혀도 되살아나는
어쩔 수 없는 멍울인가
네 뿔이 이고 있는 군청(群靑)의 하늘 아래
주린 창자 안고 가는 흰옷 입은 이웃들과
뒤틀린 발자국 같은
배리(背理)의 길도 있었지.
나눠 지닌 궁핍 앞에 바람막이로, 버티면서
묵묵히 네가 갈던 이 땅의 묵정밭에
오늘은 또 다른 문명이
짙은 그늘 딛고 섰다.
~~~~~~~~~~~~~~~~~~~~~~~~~~~~~~~~~~~~~~~~~~~~~~~~~~~~~~~~~~~~~~~~~~~~~~
처용의 탈
권 갑 하(조선일보)
돌아서 그림자 하나
짓이기듯 뭉개본다
미처 다 풀지 못해
추를 달아내린 목숨
벗어 둔
허무 한 자락
일어섰다 쓰러진다
말 없는 입술에도
사려 담은 푸른 사연
한생애 무게 만큼
애증의 불은 밝아
슬픔도
미소를 물고
여운인 듯 물이 드네.
웃지도 말 양이면
울어서는 무엇하리
눈물의 깊은 이랑
목이 메인 바람 속을
휘감아
장삼자락에
덩실대는 춤사위.
~~~~~~~~~~~~~~~~~~~~~~~~~~~~~~~~~~~~~~~~~~~~~~~~~~~~~~~~~~~~~~~~~~~~~~
소금꽃
서숙희(매일신문)
안으로만 감겨오는
한 올 인연의 끈
몸부림칠수록
매듭 붉게 맺혀오고
퍼렇게 일어서오는
아름드리 파도살
천근 무거운 돌을 달아 이 마음을 앉힙니다
관절을 다 꺾고꺾어 이 한 몸 뉘입니다
내 가진 마지막 하나 刑場에 세웁니다
얼마나 더 앓으면 이 목숨 투명합니까
밤새, 나를 때려 방파제에 묻습니다
동여맨 마음의 실밥 하얗게 터집니다
나는 그리움으로
萬頃滄波 다 말린 후
마지막 그대 앞에
단단히 앉고야말
죽어도 부서지지 않을
이 슬픔의 結晶體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93
동아일보 김태은 永宗島
중앙일보 박명숙 南原行
조선일보 정휘립 뒤틀린 굴렁쇠 되어
경향신문 이종문 석상의 노래
문화일보 정석준 해촌일기
**********************************************************************
永宗島
김태은(동아일보)
1
바람을 가르며 아침을 외치는 그대
바다를 한 자락 끌고 와 지느러밀 흔든다
등줄기 은전이 돋쳐 삶의 끈을 당긴다.
2
살집 좋은 파도와 한바탕 배지기 끝에
저만치 돌섬이 되치기로 나뒹굴고
작약도 괭이갈매기는 협심증을 앓는다.
3
낮달같이 머리 깎은 그리움 걸린 각시바위에
철 지난 가슴으로 앉아 그물 깁던 아버지는
밤마다 복고풍으로 귀밑머리 땋는다.
4
메고 온 소금꽃 더미 먼 썰물로 돌아가고
빈 소라 껍데기도 뭍으로 기어올라
장산곶 벼랑 한자락이 키를 재려 달려온다.
~~~~~~~~~~~~~~~~~~~~~~~~~~~~~~~~~~~~~~~~~~~~~~~~~~~~~~~~~~~~~~~~~~~~~~
南原行
박명숙(중앙일보)
완판본 춘향전을 따라
광한루 들어서면
열여섯 입술을 앙다물고
엉겅퀴가 피어 있다.
낮에도 가시가 돋쳐 서는
시퍼런 꿈을 쏟고 있다.
알몸뚱이 새벽마다
남은 어둠 긁어내며
한여름 들판에다
댕기채 풀던 생애
핏방울 목젖에 채우고
고슴도치 새끼를 뱄다.
남녘에 혼자 살았다는
이름없는 춘향이가
바람만 불고 가면
여기 저기 왜 그렇게 피어나는지
빈 하늘 멱살을 잡고
사랑은 말갈기 귀를 세운다.
가슴속 옥비녀 뽑아
가리마를 타는 세월
허기진 황토마루
혓바늘만 돋는 길에
읽다 만 외판본 춘향전이
숲으로 차오른다.
~~~~~~~~~~~~~~~~~~~~~~~~~~~~~~~~~~~~~~~~~~~~~~~~~~~~~~~~~~~~~~~~~~~~~~
뒤틀린 굴렁쇠 되어
정휘립(조선일보)
태초의 광야를
굴렁쇠가 굴러간다
외짝 수레바퀴
뒤틀린 굴렁쇠
한 잔 술 저녁 노을에
비틀비틀 굴러간다.
나는 배, 너는 등
엇바뀌어 돌아가면
꽃 피고 새가 울고
서리 치고 눈 내리고
숙명의 陰陽이 되어
굴렁쇠가 굴러간다.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도 둘도 아닌
우리는 뫼비우스의
어찌 못할 띠라 해도
목덜미 멍에를 벗고
날아 볼 날 없을까.
~~~~~~~~~~~~~~~~~~~~~~~~~~~~~~~~~~~~~~~~~~~~~~~~~~~~~~~~~~~~~~~~~~~~~~
석상의 노래
이 종 문(경향신문)
경주 박물관 뜰에 병신들이 모여 산다
자비를 돌로 찍었던
그 죄마저 감싸안고
아파도 들눕지 않는 돌부처가 모여 산다.
목없는 돌부처 위에 숙연처럼 앉아 있는
풀무치 날개 끝에
장삼빛 밤이 오면
천 년을 숨어 산 이의 가을 병이 도진다.
눈물나네, 눈물이 나서 눈 뒤집힌 들계집이
돌부처 코를 깨어
산약으로 다려 먹고
코없는 돌부처 앞에 밤새도록 빌었구나!
대대로 이 땅의 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봄을 봄되게 했던
섭리의 손 잃고서도
보얗게 웃는 백모란 병보다도 아파라.
천 년을 하루같이 남의 머리 이고 서서
피도 안도는데
숨인들 쉬었을까
산처럼 밀려온 놀을 어이 참고 견뎠노!
경주 박물관 뜰에 병신들이 모여 산다
말 못할 억하심정을
자비로 눌러놓고
퍼붓는 비를 맞으며 돌부처가 모여 산다.
~~~~~~~~~~~~~~~~~~~~~~~~~~~~~~~~~~~~~~~~~~~~~~~~~~~~~~~~~~~~~~~~~~~~~~
바람의 詩
이희춘(매일신문)
파계사(把溪寺)
뒤뜰에서 본
눈 먼 바람 하나
목욕재계하고
겨울문 앞에 서 있었다
눈서리 안으로 타는
발이 시린 윤회(輪廻)였다
그후
내 가슴에 와 사는 그 바람은
어느날 장미로 피다가
봄볕으로 조르다가
눈비로 꺾이우다
그도 아니면
생채기로 타다가
이승의
눈빛들이사
돌려주고 그냥 가다
바람 외려
그리운 날은
거울을 닦습니다
한고요
귀담아 열면
사바의 끝도 보입니다
눈망울
재로 닦으면
가을볕도 들립니다
~~~~~~~~~~~~~~~~~~~~~~~~~~~~~~~~~~~~~~~~~~~~~~~~~~~~~~~~~~~~~~~~~~~~~~
해촌일기
정석준(문화일보)
기압골 엉킨 구름 추락한 해안선에
끝물로 밀려 온 처용의 사연 몇 줄
목선의 틈바구니에서 삐걱이며 읽는다
구멍난 구름사이 들랑대는 젊은 파도
늘 푸를 수만 없어 북서풍 발목잡고
점잖은 산맥을 쫓아 눌러보는 하늘 끝
겹동백 선혈뿌려 저문해 웃음 짓고
물안개 주의보에 해촌은 꿈의 나라
결 삭힌 벼대를 깎아 상처난 어망을 깁고
굽은 등짝을 펴고 바다로 떠난 자여
쓰다만 일기장에 풍고 온 고향의 꿈
물살의 일렁임 속에 너의생령 누이렴
[♣위로가기]
~~~~~~~~~~~~~~~~~~~~~~~~~~~~~~~~~~~~~~~~~~~~~~~~~~~~~~~~~~~~~~~~~~~~~~
신춘문예 당선작 1994
조선일보 나순옥 새벽공단
동아일보 정성욱 겨울 벌판에서
경향신문 손수성 靑桐의 바람
서울신문 정휘립 우리들의 탈 또는 얼굴
중앙일보 정휘립 廢苑에서
부산일보 권애숙 流民의 노을 -麻依太子
**********************************************************************
새벽공단
나 순 옥(조선일보)
나른한 신새벽
가슴팍 두드리고
종소리 되돌아가는
회색 벽 공단 구역
밤 새운 공적 조서가
철망 위에 걸렸다.
피곤한 시간들이
더께로 엉겨붙어
야적장 포장 아래
선하품을 하고 있다
핏기를 잃은 외등은
잔기침만 해 대고.
등 굽은 소망들이
고철로 쌓인 자리
차라리 용광로를
가슴으로 껴안으면
의지의 굴뚝 끝에서
푸른 연기 뿜을까.
(조선일보)
*********************************************************************
겨울 벌판에서
정 성 욱(동아일보)
저 몇 겹 氷河의 땅 눈발이 날리고 있다
눈보라에 실려가는 가벼운 너의 중량
하늘로 가 닿은 길이 폭설 속에 지워진다.
사랑은 빙판 위로 맨발로 걸어오고
오랑캐꽃 속살로써 해빙하는 겨울벌판
빛살의 은하를 굴리듯 눈이 부신 凍土여.
갈증으로 찢긴 깃털 겨울새가 날아든다
첨탑에 머문 바람 지상에서 풀어지고
발목을 끌며 끌며 오는 예감의 삼월 봄날.
가슴안 푸른 수액 신열을 뒤척인다
소금끼에 절은 아픔 풀꽃으로 피어나고
다 떠난 적막을 쓸며 꿈을 꾸는 모둠발.
빛이여, 새의 부리 끝으로 돋아나는 기운이여
무시로 젖어드는 무한 속의 떠돌이 별
마지막 살에 살 비비며 어둠 속을 걷는다.
*********************************************************************
靑桐의 바람
손 수 성(경향신문)
누군가 경운기로 벌목 소리를 부리고 있다
잘 벼린 원형 톱날 자정 하늘 높이 들고
모두들 떠나간 들에 口號처럼 채우고 있다.
톱날을 곧추 세우고 어둠의 가지를 치고 있다
마음 속 튀는 불꽃, 하늘을 나는 톱밥
수천의 부리로 내려, 겨울의 발등을 쪼고 있다.
톱날이 부러지면 가슴의 날 갈아 끼우고
아름드리 어둠을 베며 막힌 길을 열고 있다.
쌓이는 톱질 소리로 겨울의 발목을 묻고 있다.
이웃해 떨고 있는 키 작은 저 떡갈나무
흔들리는 가지엔 힘살 더러 붙여 주고
언 손쯤 녹일 수 있게 흰 옷자락 감싸주고…….
베면 베는 만큼, 열려 오는 이승 벌판
못 박힌 손마디로 새벽 하늘 일구고 있다
가슴 속 가장 찬란한, 봄의 씨앗 부리고 있다.
*********************************************************************
우리들의 탈 또는 얼굴
정휘립(서울신문)
실바람 끊이질 않아 인적이 끊긴거리,
헐벗은 관목(觀木)들은 등껍질을 마저 벗고
철조망 서리에 묻힌 채 숨죽이며 울었다.
천역(賤役)의 몸뚱이로 젖은 불을 당기는 탈,
투명한 육신 쓰고 삽짝문에 들어서면
어둠은 불길 속에서 제 얼굴을 버려낸다.
덩더쿵 어깨 털고 더덩더꿍 고개 들면,
암실(暗室)벽이 파동치며 불 그림자 토해내고
응달진 고샅길에서 솟구치는 추임새들.
알찬 신바람이 어얼씨구 드세진다.
앙팡진 빛살 쏘며 내려앉던 별의 몸짓들
줄줄이 북장단을 끼고 동녘길로 나선다.
**********************************************************************
廢苑에서
정 휘 립(중앙일보)
1
저 눈(眼)은 파충류처럼 쉬이 죽은 듯싶지 않다.
제 몸을 잘라내며 꿈꾸듯 앓던 고열로
자다가 다시 일어나 視界 밖을 떠도는 돌.
2
아, 나는 아직도 배내옷 벗지 못하고
자갈뿐인 회한의 집터에 버려져 길을 잃었다,
누워야 구를 줄 아는 태엽 끊긴 시간 속에서.
3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먼 후손이 되어,
先史 깊이 퇴적된 잠과 죽음의 경련으로
바람 끝 온갖 신음들 우듬지에 스산한데…….
4
저 눈(雪)은 수장된 지 오랜 꽃잎을 띄워 날린다.
결정체만 남기고 모두 매설해버린 욕망,
명맥이 허리를 틀며 손 끝마다 돋는다.
**********************************************************************
流民의 노을
-麻依太子
권애숙(부산일보)
저무는 발길따라 물소리도 잠기는가
서둘러 짐 부리고 마음마저 다 비우고
한 자락 구름에 실려 새소리나 따르랴
떠난 자리에는 또 다른 세상 있어
무심히 귀동냥으로 산문 밖에 나섰느니
때때옷 눈부신 날이 하늘 밖에 떴구나
천년 사직은 까치놀로 떴다 지고
앙금으로 가라앉은 비린 꿈은 깨어나서
끝끝내 잠들지 못한 넋을 쓰다듬느니
이승의 마지막은 한 벌 베옷이라
얼룩져 너덜대는 무릎까진 넝마자락
쌓이는 어둠에 덮여 영욕도 잠드는가
[이 게시물은 웹도우미님에 의해 2019-02-14 18:06:36 문학자료실에서 이동 됨]
|
|
 Total 7
Total 7
|
|

